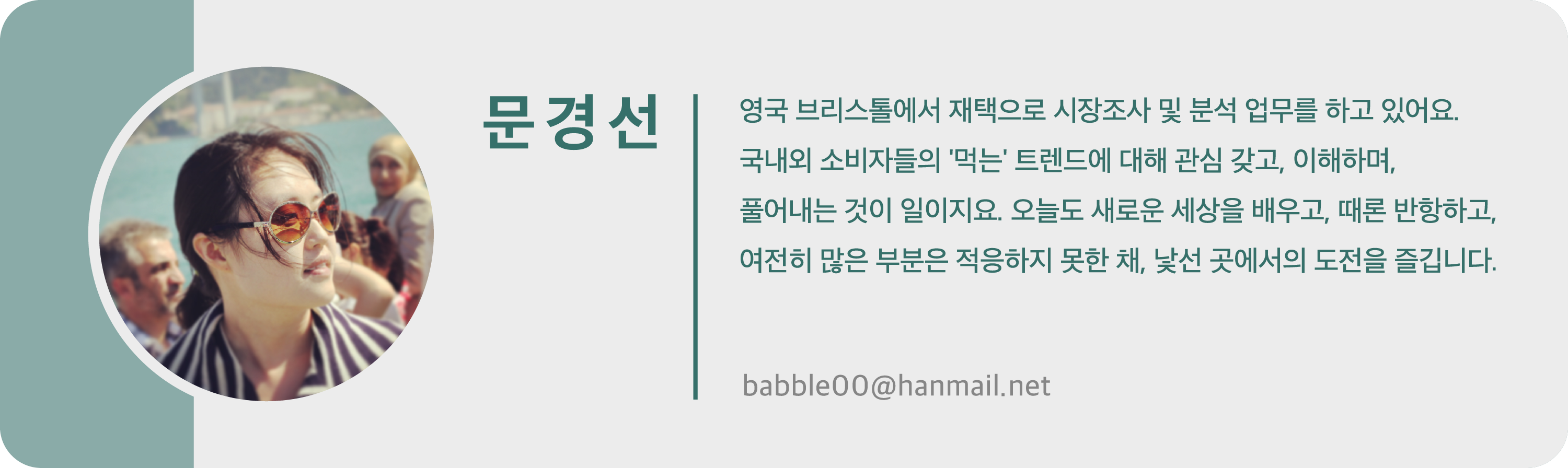한국 직장의 숨은 커뮤니케이션 난제, ‘알아서…’
한국 직장의 숨은 커뮤니케이션 난제, ‘알아서…’
한국 직장에서 신입사원에게 필요한 업무 스킬 중 하나는 ‘알아서’ 할 일을 찾는 것이다.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직장 드라마 ‘미생’에서도 미운오리새끼 취급을 받던 장그래와 안영미가 각팀에서 팀원으로 인정받기까지 그들은 별다른 상사의 지시 없이 ‘알아서’ 업무를 찾아 해내며 조금씩 상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드라마 내용을 토대로 국내 언론 기사 및 블로그에서는 신입사원의 직장생활 꿀팁이라며 ‘‘알아서’ 업무를 찾아 할 것!’ 이라고 조언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국인에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야 할 일을 찾아내고, 주어진 것 외에 예상되는 추가 작업들까지 마무리 하는 것이 어쩌면 학창시절부터 베어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학교 숙제를 할 때도, 대학에서 리포트를 제출할 때도 요구한 핵심 내용 외에 추가적인 배경 설명이나 예시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노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러한 인정받는 자들의 습관은 직장생활까지 이어지며, “최근 실적자료 좀 가져와봐” 란 상사의 한 마디에 한국인 신입사원들은 분기별, 월별, 주간 별, 시간 별 데이터는 물론 시키지도 않은 채널 별 판매 실적, 주요 소비자 분석, 타사 제품과의 차이점 분석 등을 함께 제출하곤 한다. 돌아오는 피드백은 “너 일 좀 하는구나”라는 상사의 칭찬과 만족.
이런 ‘알아서’ ‘당연히’ 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근무를 할 경우, 이는 직장 내 ‘미스커뮤니케이션’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 회사의 싱가포르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욱범(37)씨는 현지 외국인 직원들과의 업무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한국에서 하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회상한다. 예를 들어, 현지 직원들에게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 리스트를 제출하되, 특히 A요소를 중심으로 파악하라고 요청하면, 정말 A요소만 고려한, B와 C라는 또 다른 중요 요소를 배재한 후보업체 리스트를 가져온다. 결과물에 대해, B와 C 요소에 대해 물어보면 “네가 A 요소를 고려하라고 했잖아. B와 C요소는 생각 안 해봤어.” 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는 것.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 문화가 당연하지 않은 외국인과 업무를 할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전달이 필요하다.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기대는 이처럼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상황들을 초래하기도 한다.
반면 박 씨는 이후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으로부터 ‘Very well organised person’ 이라는 칭찬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했다. 학교에 서류를 제출할 때나, 학교에 레터를 요구할 때, 행정직원들이 본인에게 추가 질문을 할 필요 없이 관련 내용을 한꺼번에 ‘알아서’ 제공한 덕분이다. 그는 “한국회사에서 7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몸에 베인 습관”이 노하우 아닌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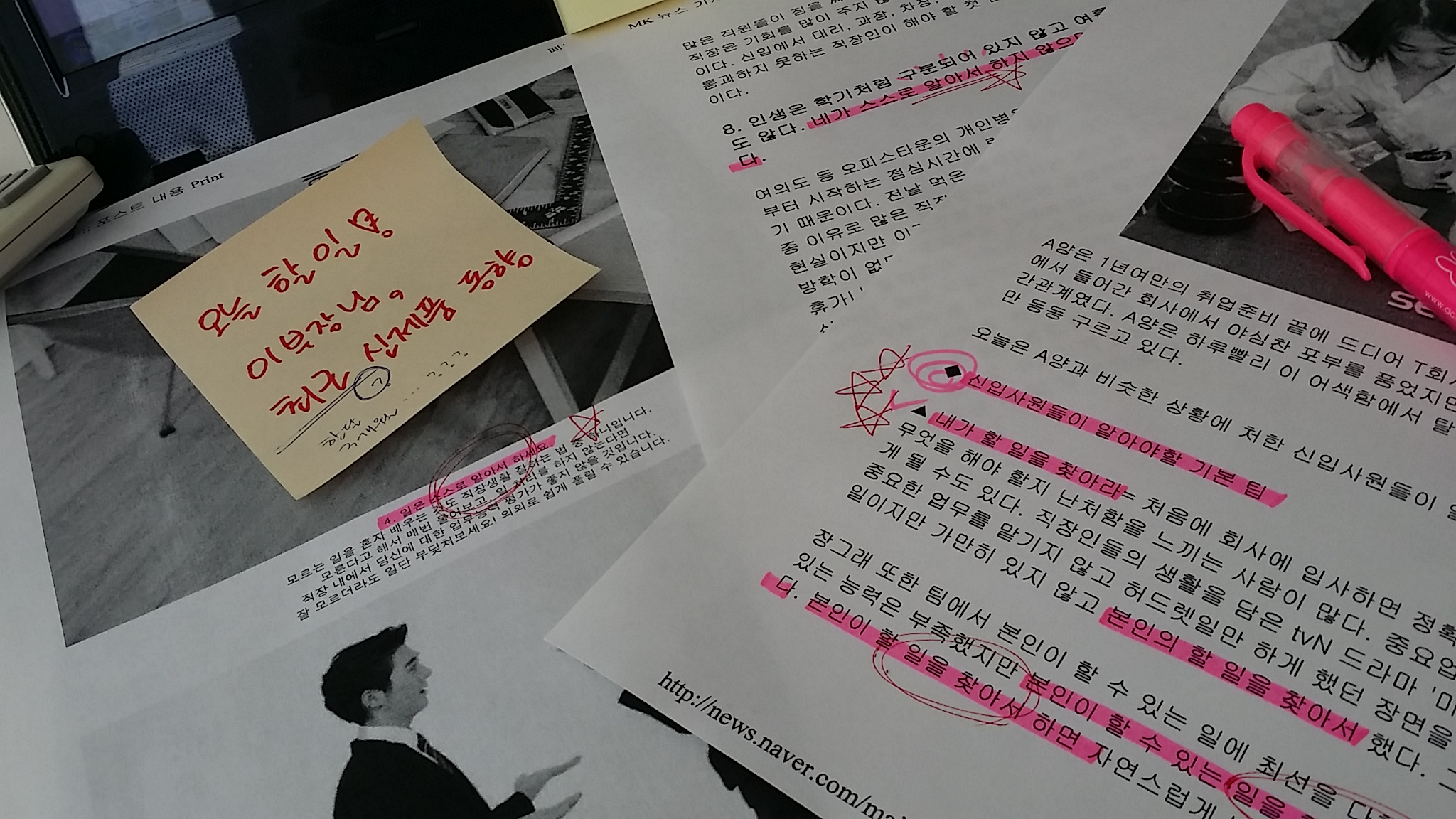
한국 직장 내에서는 범위가 모호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도 만연해 있는 편이다. 보고서에 모르는 용어가 나올 경우 이는 모르는 사람 잘못이다. 드라마 ‘미생’에서도 아무도 신입사원에게 생소한 무역 용어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미 대학 때 배워 오거나, 장그래가 그랬듯이 무역용어 사전을 옆에 두고 혼자 익혀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영국계 다국적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는 FMCG(Fast Moving Consumer Goods)산업에 대한 시장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80개국에 대한 보고서에는 새로운 용어가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편이며, 이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한국의 Social Commerce 및 SNS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소개한 필자의 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해, 최근 다른 나라 직원들로부터 “이게 뭐야? SMS를 잘못 쓴 거야?”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알 수 있는 용어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나?’ 싶었는데, 회사 내부에서는 ‘내가 당연히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음’을 기본적으로 감안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즉, Social Commerce나 SNS의 경우 이미 IT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용어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글로벌 오피스의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이다.
기업과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인 고객들은 기업이 ‘알아서’ 불편한 요소를 파악해 해결하는 서비스를 기대하고, 이러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한국 기업들의 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글로벌 사회에서 크게 이견이 없는 편이다. 하지만 외국에 살면서 현지 기업들이 ‘알아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바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집 월세 계약을 맺을 때, 한국은 부동산중개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주는 문화다. 부동산 계약 사항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중개업자는 앞으로 필요하게 될 서류들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계약은 한번의 만남으로, 단 몇 시간이면 완료된다.
하지만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 Letting Agent가 고객의 마음을 읽어 ‘알아서’ 해주는 경우는 없다. Agent는 계약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동안, 다음 단계에서 필요할 지도 모르는 준비사항에 대해 미리 언급하지 않는다. 일단 현재의 단계가 깔끔하게 해결돼야 다음단계로 넘어가던지 할 수 있으며, 그때 가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도 된다는 마인드. 이러한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고 다음단계를 미리 대비하고 싶은 한국인 고객들은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단계별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Agent에 서운함을 넘어 불신까지 갖게 되기도 한다.
하자 있는 제품의 A/S를 신청하거나, 명백한 기업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봤을 경우에도 민원 처리 과정은 대부분 비슷하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상황을 열 가지면 열 개 다 일일이 문의하지 않으면 ‘알아서’ 속 시원한 대답을 듣기는 쉽지 않다.
‘너도 내 맘 같으리’라는 한국인 특유의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때론 굳이 설명하고 가르쳐야 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니까 너도 알겠지’ 가 아닌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를 수도 있지’ 라는 배려의 커뮤니케이션은 긍정적인 사내 인간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