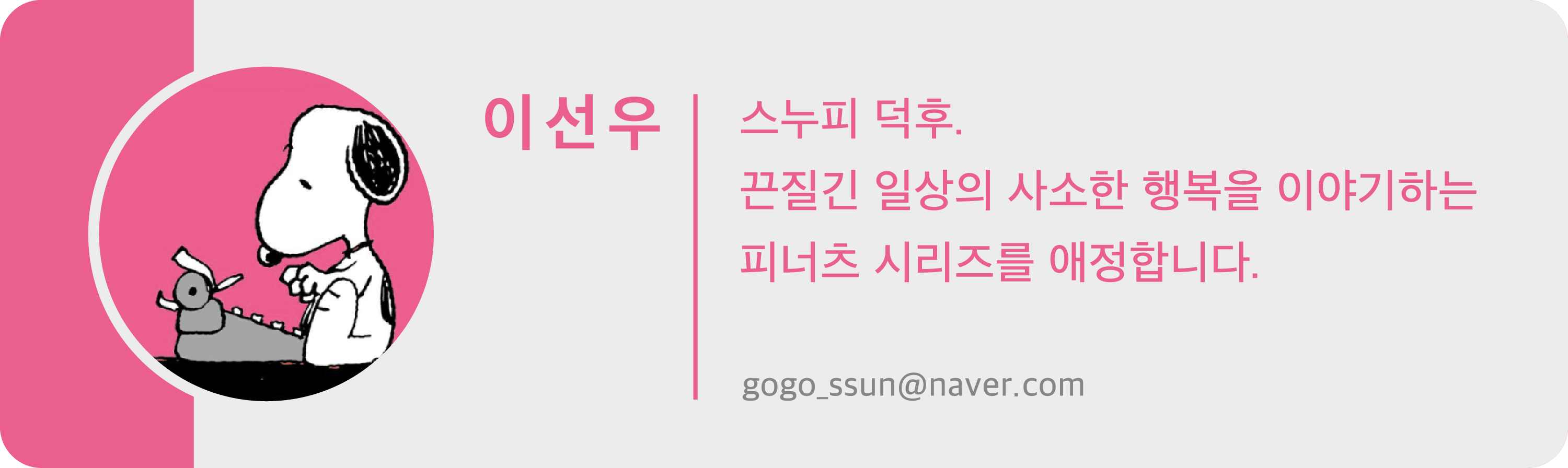왜 아직도 우리는 일 하는 시간에 집착하는가?
왜 아직도 우리는 일 하는 시간에 집착하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모 홍보대행사에서 인턴으로 6개월간 일한 적이 있다. (준)사회인이 되었다는 설렘을 가득 안고 회사에 출근한 첫 날, 선임인턴은 내게 “야근을 하고 싶지 않으면 처음부터 ‘칼퇴 캐릭터’를 잡으라”고 회사 생활 팁을 알려줬다.
팀장님의 눈칫밥을 견디며 처음 한 달 정도 칼퇴를 하면 ‘칼퇴하는 애’로 포지셔닝 돼서 ‘눈치 보는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설명이었다. ‘정시 퇴근이 회사 생활 팁이라니.. 일 다해서 집에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냐?’ 라고 생각했던 나는 선임 인턴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 들었고, 그 업보(?)로 인턴 6개월 간 저녁 없는 삶을 보내야 했다.

(Source: Let’s CC)
정직원이 되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눈치와 야근이 기다리고 있다. 모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A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하지만 저녁 7시 반은 되어야 눈치 보지 않고 퇴근을 할 수 있다며 친구는 하소연을 늘어 놓는다. 저녁 6시 퇴근만 되어도 ‘칼퇴’, 7시는 ‘그냥 퇴근’, 밤 9시 반은 넘겨야 되어야 ‘야근’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회사 분위기라고.
어떻게 6시 퇴근이 ‘칼퇴’가 될 수 있는 걸까. 6시에 퇴근하는 건 1시간 동안이나 추가 근무를 한 엄연한 ‘야근’이다. 하지만 팀장님은 6시에 퇴근하는 직원에게 “칼퇴하는 거냐”며 눈치를 주기 때문에 7시는 되어야 직원들이 하나 둘 퇴근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근로 계약서에는 출퇴근 시간이 분명히 나와있지만, ‘7시 퇴근’이 무언의 약속처럼 자리잡은 것이다. 그렇게 친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무려 11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낸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연간 근로시간’이 긴 나라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일하지만 ‘1인당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하위권(23위)에 속하는 아이러니를 보인다. 야근이 곧 업무 성실도, 인사고과로 평가되는 조직 문화 때문에 업무가 없어도 한국의 직장인들은 늦게까지 자리를 지킨다. ‘어차피 오늘도 야근할 거’ 5시까지 열을 내어 굳이 업무를 마칠 필요가 있을까. 업무가 많지 않아도 일을 오래, 비효율적으로 하며 ‘야근의 악순환’에 빠지는 게 일종의 기업 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다.
해외에는 ‘칼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다. 잡지사에서 일했을 당시 해외취업과 관련된 기사를 쓰기 위해 호주 디자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B씨를 인터뷰 한 적이 있었다.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일을 하다 호주의 디자인 회사로 이직한 B씨는 ‘야근 선호 문화’는 한국에만 있는 희한한 문화이며, 외국에서는 야근이 잦은 사람을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에 퇴근하는 건 근로법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야근’을 한다는 건 주어진 근무시간에 업무를 끝내지 못한 것이기에 개인의 부족한 역량 문제로 평가 받는 다는 것이었다.
또한 야근을 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야근하는 직원’을 좋게 평가할 수 만은 없다고. 야근이 없는 정시퇴근 환경에서 업무 효율성은 어떨까?
한국 화장품 회사에서 근무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호주에서의 근무시간이 훨씬 짧지만 업무 집중도, 근무 만족도는 배로 높다고 B씨는 말했다. 오후 4시에 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간에 집중해야만 하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높고, 퇴근 후 저녁 시간을 즐기며 하루의 피로를 풀기 때문에 다음 날 좋은 컨디션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가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힘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근로시간 = 생산성’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근무시간과 업무량보다는 창의성과 효율성이 중시되는 ‘스마트 워크’시대다.
‘얼마나 오랫동안 일했느냐’ 보다 ‘얼마나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가’가 업무 성과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정해진 근무 시간 내에 업무 집중도,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퇴근 후 저녁 시간을 활용해 채울 수 있는 근로자 개인의 행복, 자기 개발 시간은 기업의 경영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몇몇 기업 야근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거나, ‘집중 근무시간제’를 도입해 근무시간 동안 협업과 몰입을 강화시켜 정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한킴벌리의 경우, 필수 야근자만 제한적으로 야근을 허용, 7시 반 이후 강제 소등하는 제도로 야근하는 직원의 비율을 3년 사이에 20%에서 8%로 줄였는데, 야근 없이 하루 8시간 근무에도 업무 성과나 생산성 저하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해진 근무 시간 내에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높아졌고, 퇴근 후 휴식, 자기개발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무 효율성과 장시간 업무 시간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한킴벌리의 사례로, 호주의 기업문화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장시간 회사에서 자리를 지키는 ‘부지런한 비효율’ 눈치 보는 ‘야근 문화’를 뿌리 깊은 관행으로 갖고 있다.
야근을 ‘성실함, 업무 능력’으로 평가하고, 칼퇴를 일종의 ‘특권’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변화를 이뤄낼 때, 근로자 개인과 기업이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문화’가 형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