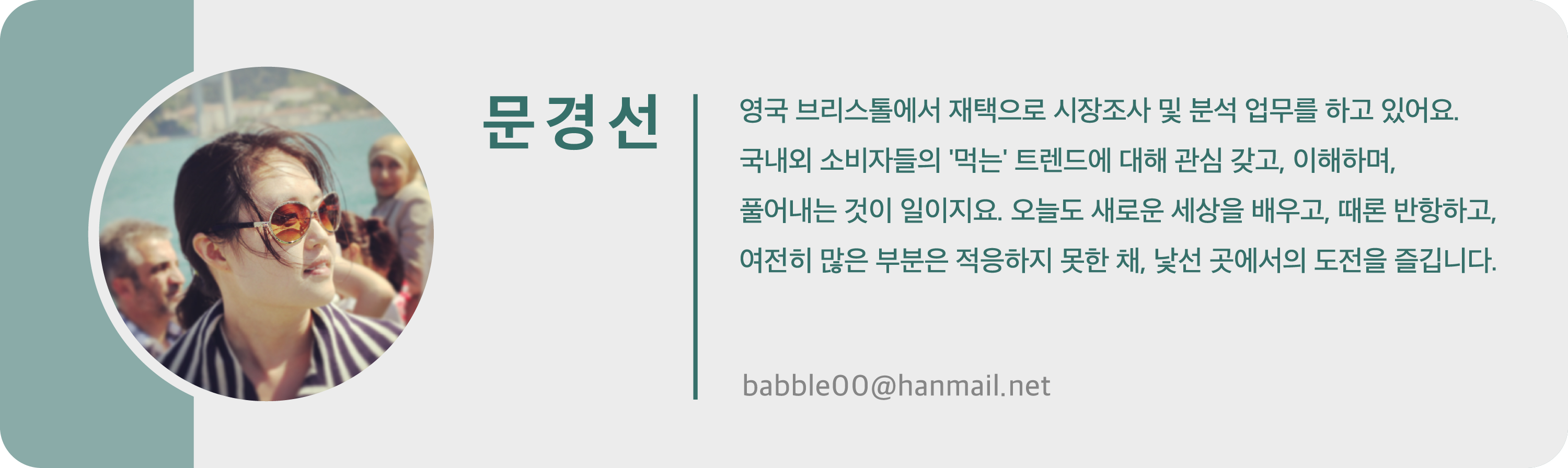영국 사람들이 느긋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된 배경
영국 사람들이 느긋하고 여유롭게 살수 있게 된 배경
얼마 전, 영국의 유명한 휴가지 중 하나인 콘월(Cornwall)에 다녀왔다. 길지 않은 영국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고운 모래 비치가 일품인 곳이라 어딜 가나 차가 많았다. (많은 영국인들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 직접 캠핑카(campervan)를 몰고 오거나 카라반(caravan)을 달고 다녀서 그런지 사람이 북적인다는 생각은 못했지만 주차공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한창 피크시즌인 휴가지에서 얘기치 않게 영국인들의 일관된 삶의 태도를 곳곳에서 접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해변 근처에 있는 꽤 넓은 주차장은 이미 ‘Full’ 이었다. 한 줄서기를 하듯, 차들은 주차장 밖 골목 한편에 순서대로 차를 대고, 한대가 나가면 한대가 들어가는 식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다. 필자는 정말 빈자리가 없나 싶어 차에서 내려 주차장을 둘러봤다. 이중 주차를 하기에 충분할 만큼 주차장 내, 차들이 오가는 도로는 넓었고, 주차선이 없어도 옆에 한대 정도는 나란히 세울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은 여기저기 남아돌았다. 순간 답답했다. 나처럼 주차장을 둘러보고 있는, 우리보다 앞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서 내린 사람에게 슬쩍 물었다. “여기는 충분히 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대답은, “No, no, no.” 시간은 자꾸 흐르고 태양은 뜨겁고 파도소리는 매혹적인데, 그 누구도 주차선이 없는 공간엔 주차를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다. 결국 우리도 두 시간 여의 기다림 끝에 정상적(?)인 주차공간에 차를 대고 해변을 즐길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가 막히기 시작했다. 뒤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왔고, 고속도로는 신속히 가운데 길이 열렸다. 사고차량으로 그렇게 한 시간 가량 고속도로 위에 갇혀있었다. 영국 도로에는 종종 2차선 크기의 parking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갓길과 비슷하지만 100여 미터 정도에 걸쳐 도로와 구분되도록 화단을 만들어놔 안전하게 차를 대놓고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곳으로 진입했다 100여 미터 앞으로 다시 빠져나오면, 사실 실제로 휴식을 취하고 빠져나오는 차량인지, 얌체족인지 알 수 없음에도, 그곳으로 우회하는 차는 한 시간 동안 단 한대도 없었다.
가끔은 너무 원리원칙대로 일 처리를 하는 영국인들이 때론 답답했었는데, 이번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상에 녹아있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느끼며, 진짜 선진국은 숫자 지표가 아닌 저변에 깔린 국민성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원칙을 중시하는’ 영국인들의 삶의 태도 및 국민성은 자신의 삶의 일부인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 영국은 노동시간을 규정한 관련 법규가 없다. 어쩌면, 굳이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이들은 노동과 여가의 균형이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각각의 원칙을 일상생활에서 습관처럼 또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다.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불법 노동자
최근 OECD 가입국가 가운데 한국인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무려 2193시간을 기록해,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한국의 법적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니, 1년을 52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한국인은 연간 208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불법이다. 물론 근로기준법은 ‘당사자 간 합의’ 하면 주당 12시간 연장근무를 인정하고, 특례조항으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일부 업종이라 함은 ‘금융업, 통신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등 이런 식으로 매우 포괄적이어서 웬만한 산업은 다 들어가는 데다, 마지막 조항엔 ‘그 밖에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에 대해 법적으로 반기를 들 수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는 별로 없어 보인다. 즉, 노동시간과 관련 ‘일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아니 거의 없다는 얘기다.
반면, 영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663시간으로 그들은 한국인의 80% 정도만 일하면서, 한국인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을 (GDP기준) 받고 있는 셈이다. 회사가 나서서 근로자들이 퇴근하도록 종용하거나 명절 또는 공휴일에는 업무에 관심을 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 또한 영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는 회사 발전방안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유로모니터는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각 대륙에 지역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마다 휴일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 사무실의 시스템은 다르지만 ‘쉴 때 쉬는 것을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은 똑같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주부터 새해 첫 주까지 2주 동안 런던 사무실은 아예 문을 닫는다. (사실, 이때는 교통수단도 최소한만 운영되기 때문에 출근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한편, 음력 설을 지내는 중국 법인은 구정(Chinese New Year)이 포함된 한주 동안 역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미국의 부활절(Easter holiday), 추수감사절(Thanks Giving day),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모든 상점들도 문을 닫고 근로자들은 긴 휴가를 떠난다는 건 한국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글로벌 문화이기도 하다.
보통 근무를 하지 않는 법정 공휴일을 표현할 때, 한국어로는 ‘쉬는 날’ 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Office is Shut Down’ 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행위의 주체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사무실)가 문을 닫는다 (그러니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가 되는 것. 다르게 해석해보면, 한국어로는 쉴지, 안 쉴지는 내가 선택할 문제임으로 바쁘면 휴일에도 사무실에 나갈 수 있음을, 그렇다면 항시 열려있는 사무실은 ‘웰컴(Welcome)’이란 얘기일 수 있다. 영어로는 사무실도, 시스템도, 동료들의 휴대전화도 모두 shut down 됨으로 혼자 일할 수 있으면 해보던지…… 의 의미가 아닐는지.
느리게 살기. 오래된 일과 삶의 균형에서 비롯된, 곳곳에 배어있는 삶의 여유

‘가진 자의 여유’라는 말처럼, 풍요로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영국인들은 매사에 참으로 느긋한 편이다. 그 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격은 운전을 해보면 ‘딱’ 알 수 있는데, 한국과 영국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다른 경험이다. 고백하건대, 필자는 조심성이 약간(?) 부족하고 기계치인 탓에 한국에서는 반 칠순이 되도록 몇 차례 운전을 시도했다가 긴장감에 스트레스받는 것이 싫어서 그만뒀다. 물론 서울에 살면 대중교통만으로 크게 불편하지 않아서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은 이유도 있다지만, 차선변경 조차 쉽지 않은 초보자에게 서울 도로는 정글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대중교통 가격이 기름값 보다 더 비싼 영국에 적응하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1년여 동안 운전을 하며 차선 변경을 하거나, 길을 잘못 들어 본의 아니게 끼어들기를 해야 할 때, ‘어렵다’고 느낀 기억이 없다. 방향 지시 등을 켜거나 손을 들어 ‘excuse’를 표현하면, 10명 중 9.5명은 양보를 해줬고, 자동차 경적을 누를 일도 들을 일도 거의 없었다. (이는 영국에서 세 번째 규모의 도시인 브리스톨(Bristol)에서의 경험이라, 런던은 교통 환경이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여전히 필자 역시 적응 안 되는 영국의 도로 규칙 중 하나는 자전거와 도로를 공유하는 것. 대부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만, 전용도로가 없는 길에서 자전거는 자동차로 고려되는데, 차선변경이나 추월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천천히 자전거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이 상황 자체가 한국 운전자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자전거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운전자를 본 적이 없다.
초고속 산업발전을 일궈내며 뿌리내린 한국의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원칙은 지금까지도 노동환경 그대로 녹아나, 1인이 1.5인의 생산량을 담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근로 문화를 만들었고, 휴식과 여가 시간을 갈망하게 된 한국인들은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을 용납하기 힘들었다. 길고 길었던 일의 영역에서 넉넉하지 않은 여가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또는 그 반대로 가는 사람들의 심리상태가 고대로 반영된 것이 대한민국의 출퇴근 길, 도로 위가 아닐까 싶다.
일과 삶의 균형 맞추기, 우리도 해보자.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역시 근로시간 줄이기, 휴일엔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 즐기기 등에 대한 인식이 폭증했고 이를 위한 개인과 기업의 노력, 그 사례들이 제법 자주 소개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 기업들이 ‘여가 생활을 즐기자’는 캠페인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해 호평받고 있으며 이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기도 했다. 최근 캠핑 관련 산업 규모가 급성장 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캠핑아웃도어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캠핑산업 규모가 2008년 200억에서 지난해 6,000억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캠핑인구 역시, 2010년 60만 명 수준에서 2013년 기준 13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지난해 역시 1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민국 인구를 대략 5,000만 명으로 계산했을 때, 인구의 1% 남짓이던 사람들만이 향유하던 캠핑문화를 지금은 6%가 넘는 인구가 즐기고 있다는 뜻이다.
캠핑문화의 확산은 일부 예능프로그램의 인기 덕도 있지만, 캠핑은 평소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탁 트이고 한가로운 자연에서 쉬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기도 하다. 일찌감치 그러한 욕구가 문화로 자리 잡은 영국의 경우, 꼭 유명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캠핑장 시설이 흔한 것은 물론, 집 앞 주차장에 캠핑카(campervan) 또는 카라반(caravan)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여행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지 않아도, 발길 닿는 대로 떠나보는 것, 때론 동네 공원에서 부담 없이 바베큐와 캠핑을 즐기는 그들의 모습에서 화려하지 않지만 소박하고, 진정한 삶의 여유가 느껴져 필자 역시 마냥 부러울 때가 많다.
조만간, 한국 근로자들에게도 가족, 친구들과 ‘캠핑’ 정도는 가볍고 소박하게 즐길 수 있는, 흔한 여가시간을 여유롭게 즐기는 날을 기대해 본다.